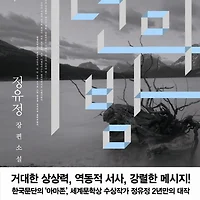신형철의 산문집 <느낌의 공동체>를 읽다. 이 젊은 평론가의 미문과 안목은 일찌감치 감탄스러웠으며, 역시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그로부터 해설을 받기 위해 대기중이라는 소문까지 들은 적 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신형철의 평론, 특히 시에 대한 것은 매우 매혹적이어서, 그 평론을 읽고 당장이라도 원 텍스트를 손에 넣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곤 했다. 그 시인이 내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또 하나의 장점은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다. 손에 쥐어진 연필이 없을 때, 난 이런저런 문장에 밑줄을 긋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이런 문장들은 밤식빵 속의 밤과 같아서, 글 전체의 식감을 높여준다. 어디 가서 인용하거나 특히 트위터에 올리면 여러 차례 리트윗될 문장들. 글쟁이들에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질시를 유발한다.
허나 아쉬운 점. 책 전체에서 '혹평'을 찾기 힘들었다는 것. 책에 언급된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신형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건 고은의 신작 시집과 창비시선의 300권째 시집 정도다. 특히 고은의 <허공>에 대한 평가는 혹독해서, "일독 이후 되돌아보지 않았다"고 표현하거나 "백 편을 쓰는 에너지로 서너 편의 걸작을 세공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건방진 생각"까지 나온다.
그러나 그 이외의 시인, 소설가 등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호평이다. 많은 직업적 평자들의 딜레마는 지면과 시간은 적고 평해야할 텍스트는 많다는 것이다. 좋지 않은 텍스트가 왜 좋지 않은지 설명하는데 지면과 시간을 낭비하느니, 좋은 텍스트가 왜 좋은지를 설득하는 편이 효율적이긴 하다. 특히 문학의 영토가 날로 좁아지는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동업자 의식'은 소중한 것일 수 있다.
나도 소개되는 영화들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보태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에 문학평론가의 처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텍스트 뿐 아니라 창작자들 또한 접할 기회가 많기에, 텍스트를 비판할 때 그 뒤의 사람이 어른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짚어봐야할 점은 <느낌의 공동체>의 저자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것. 아마추어라면 원하는 텍스트만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권리가 있지만, 프로라면 원치 않는 텍스트도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해야할 직업적 의무가 있다. 특히 '원치 않는 텍스트'가 한 세대를 풍미한 대가 혹은 장래가 밝은 유망주일 때, 이들의 태작에 대해 침묵하기보다는 소리 높여 삿대질 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라고 나는 믿는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다. 손에 쥐어진 연필이 없을 때, 난 이런저런 문장에 밑줄을 긋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이런 문장들은 밤식빵 속의 밤과 같아서, 글 전체의 식감을 높여준다. 어디 가서 인용하거나 특히 트위터에 올리면 여러 차례 리트윗될 문장들. 글쟁이들에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질시를 유발한다.
허나 아쉬운 점. 책 전체에서 '혹평'을 찾기 힘들었다는 것. 책에 언급된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신형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건 고은의 신작 시집과 창비시선의 300권째 시집 정도다. 특히 고은의 <허공>에 대한 평가는 혹독해서, "일독 이후 되돌아보지 않았다"고 표현하거나 "백 편을 쓰는 에너지로 서너 편의 걸작을 세공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건방진 생각"까지 나온다.
그러나 그 이외의 시인, 소설가 등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호평이다. 많은 직업적 평자들의 딜레마는 지면과 시간은 적고 평해야할 텍스트는 많다는 것이다. 좋지 않은 텍스트가 왜 좋지 않은지 설명하는데 지면과 시간을 낭비하느니, 좋은 텍스트가 왜 좋은지를 설득하는 편이 효율적이긴 하다. 특히 문학의 영토가 날로 좁아지는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동업자 의식'은 소중한 것일 수 있다.
나도 소개되는 영화들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보태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에 문학평론가의 처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텍스트 뿐 아니라 창작자들 또한 접할 기회가 많기에, 텍스트를 비판할 때 그 뒤의 사람이 어른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짚어봐야할 점은 <느낌의 공동체>의 저자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것. 아마추어라면 원하는 텍스트만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권리가 있지만, 프로라면 원치 않는 텍스트도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해야할 직업적 의무가 있다. 특히 '원치 않는 텍스트'가 한 세대를 풍미한 대가 혹은 장래가 밝은 유망주일 때, 이들의 태작에 대해 침묵하기보다는 소리 높여 삿대질 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라고 나는 믿는다.

'텍스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프로이트의 환자들> (0) | 2011.09.23 |
|---|---|
| 슈미트, 마키아벨리, 지젝 (0) | 2011.09.04 |
| 영화의 길, 소설의 길, <7년의 밤> (0) | 2011.09.03 |
| 간디의 두 얼굴, <마하트마 간디 불편한 진실> (0) | 2011.08.26 |
| 과학보다 큰 것이 있다-존재하는 신 (0) | 2011.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