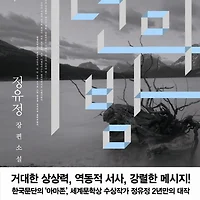한때 '간디 XXX' 이런 유행어가 돈 적이 있는데, 시뮬레이션 게임 <문명> 시리즈에서 인도를 대표하는 간디가 힘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문명2>와 <문명3>를 해본 적이 있는 나로서는, 이 시리즈가 '도끼 자루 썩는' 게임이라는걸 알고 있다. 만일 이 나라에 아주 조금만 더 독재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내가 벼락을 맞아 훌륭한 민주투사가 되고, 그래서 내가 가택연금이라도 당한다면, 나는 당연히 <문명> 시리즈의 최신판을 밀반입해 놀겠다. 간디에 대한 책 리뷰의 서문에 흰소리 했음.

▲마하트마 간디 불편한 진실…E. M. S. 남부디리파드 | 한스컨텐츠
모든 인간에겐 흠이 있다. 인간적인 약점, 판단 착오 없는 삶은 없다. 그러나 간혹 ‘성인(聖人)’이라는 후광이 덧씌워진 사람에게서 대중은 어떠한 흠결도 보려 하지 않는다. 인도의 좌파 정치인이자 케랄라주 총리를 두 차례 역임한 E. M. S. 남부디리파드에겐 마하트마(위대한 영혼) 간디가 그러했다.
남부디리파드가 보기에 간디는 빼어난 정치인이었다. 그의 이상주의와 대담한 행동이 인도 민중을 하나로 뭉치게 해 영국에 대항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 부패와 사익에 물든 동료들과 달리 생애 마지막 날까지 청렴했다. 그러나 간디의 정치는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위해 복무하고 있었다.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스와라지(자치) 운동을 이끄는 도중에 몇 차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간디는 위대했지만, 신격화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아직 ‘마하트마’가 아닌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였던 젊은 시절, 그는 식민 종주국 영국에서 공부했다. 자본주의 초기 단계였던 당시 영국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상륙했고,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는 등 온갖 급진적·지적 정치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졸업 후 변호사가 된 간디가 가장 관심을 가진 운동은 ‘채식주의’였다. 간디는 1909년 발간된 문건에서 ‘근대 문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의학은 흑마술의 진수를 모은 것이다” “성병 치료나 결핵 치료를 할 병원이 없다면 결핵도 줄어들고 매춘도 줄어들 것이다” “철도, 전신, 병원, 법률가, 의사 같은 것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간디는 “제국주의 착취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인류의 문명에서 근대적이고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모든 것을 비난하는 한 인간”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쯤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특유의 강직한 품성과 지적 능력으로 금세 민족정치운동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이 시기 영국이 인도 젊은이들을 모병해 전선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비폭력운동의 최고 지도자는 놀랍게도 “제국이 쇠퇴하면 우리가 간직해온 소망도 같이 쇠퇴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국주의 전쟁에 인도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보내고, 그 보상으로 자치를 얻어내겠다는 전술이었다. 간디는 스스로 명확하게 ‘대영제국의 친구’임을 밝혔다. 인도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만족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간디의 비폭력운동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평가한다. 간디가 폭력을 혐오한 이유는 “단지 노동자계급이 가진 투쟁의 무기로 정치적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운동은 설정한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르주아지로서의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간디는 종교와 계급이 다른 수억명 인도인을 하나로 뭉치게 했지만, 민중의 운동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포함한 소수 엘리트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1947년,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많은 국민회의 지도자들이 환호했지만, 간디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전조임을 직감할 정도로는 냉철했다. 그동안 하나가 돼 영국과 싸웠던 힌두와 이슬람은 독립 이후 분열돼 상대방에 대한 테러를 이어갔다. ‘힌두 우익’ 간디는 결국 ‘힌두 극우’ 활동가의 손에 1948년 암살됐다. 그러나 오늘날의 힌두 극우들은 제 입맛에 맞게 간디를 호명해 호가호위하는 상황이다.
1958년 초판이 발간돼 간디의 공과를 모두 밝힌 선구적 저작으로 인정받아온 책이다. 정호영 옮김.
모든 인간에겐 흠이 있다. 인간적인 약점, 판단 착오 없는 삶은 없다. 그러나 간혹 ‘성인(聖人)’이라는 후광이 덧씌워진 사람에게서 대중은 어떠한 흠결도 보려 하지 않는다. 인도의 좌파 정치인이자 케랄라주 총리를 두 차례 역임한 E. M. S. 남부디리파드에겐 마하트마(위대한 영혼) 간디가 그러했다.
남부디리파드가 보기에 간디는 빼어난 정치인이었다. 그의 이상주의와 대담한 행동이 인도 민중을 하나로 뭉치게 해 영국에 대항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 부패와 사익에 물든 동료들과 달리 생애 마지막 날까지 청렴했다. 그러나 간디의 정치는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위해 복무하고 있었다.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스와라지(자치) 운동을 이끄는 도중에 몇 차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간디는 위대했지만, 신격화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아직 ‘마하트마’가 아닌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였던 젊은 시절, 그는 식민 종주국 영국에서 공부했다. 자본주의 초기 단계였던 당시 영국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상륙했고,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는 등 온갖 급진적·지적 정치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졸업 후 변호사가 된 간디가 가장 관심을 가진 운동은 ‘채식주의’였다. 간디는 1909년 발간된 문건에서 ‘근대 문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의학은 흑마술의 진수를 모은 것이다” “성병 치료나 결핵 치료를 할 병원이 없다면 결핵도 줄어들고 매춘도 줄어들 것이다” “철도, 전신, 병원, 법률가, 의사 같은 것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간디는 “제국주의 착취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인류의 문명에서 근대적이고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모든 것을 비난하는 한 인간”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쯤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특유의 강직한 품성과 지적 능력으로 금세 민족정치운동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이 시기 영국이 인도 젊은이들을 모병해 전선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비폭력운동의 최고 지도자는 놀랍게도 “제국이 쇠퇴하면 우리가 간직해온 소망도 같이 쇠퇴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국주의 전쟁에 인도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보내고, 그 보상으로 자치를 얻어내겠다는 전술이었다. 간디는 스스로 명확하게 ‘대영제국의 친구’임을 밝혔다. 인도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만족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간디의 비폭력운동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평가한다. 간디가 폭력을 혐오한 이유는 “단지 노동자계급이 가진 투쟁의 무기로 정치적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운동은 설정한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르주아지로서의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간디는 종교와 계급이 다른 수억명 인도인을 하나로 뭉치게 했지만, 민중의 운동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포함한 소수 엘리트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1947년,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많은 국민회의 지도자들이 환호했지만, 간디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전조임을 직감할 정도로는 냉철했다. 그동안 하나가 돼 영국과 싸웠던 힌두와 이슬람은 독립 이후 분열돼 상대방에 대한 테러를 이어갔다. ‘힌두 우익’ 간디는 결국 ‘힌두 극우’ 활동가의 손에 1948년 암살됐다. 그러나 오늘날의 힌두 극우들은 제 입맛에 맞게 간디를 호명해 호가호위하는 상황이다.
1958년 초판이 발간돼 간디의 공과를 모두 밝힌 선구적 저작으로 인정받아온 책이다. 정호영 옮김.

'텍스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업적 예의, <느낌의 공동체> (0) | 2011.09.03 |
|---|---|
| 영화의 길, 소설의 길, <7년의 밤> (0) | 2011.09.03 |
| 과학보다 큰 것이 있다-존재하는 신 (0) | 2011.08.13 |
| 시오노 나나미, <십자군 이야기> (0) | 2011.07.18 |
| 서부는 어디인가-잭 런던과 코맥 맥카시의 경우 (0) | 2011.06.26 |